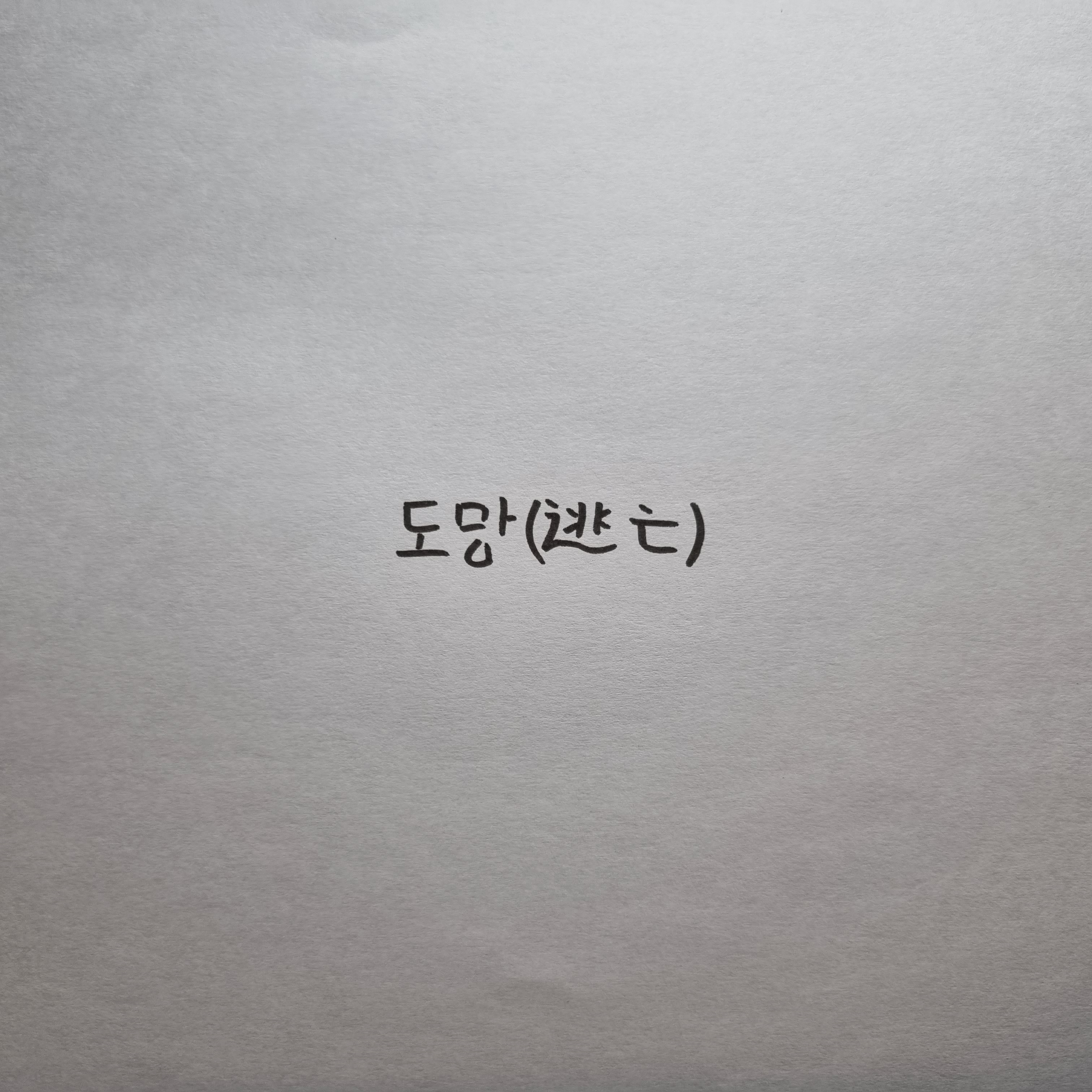
H는 항상 도망쳤다. 꿈에서까지 도망치고 있었다. H는 항상 숨을 헐떡였다. 눈은 퀭했으며,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H의 모습은 장례식을 연달아 치른 사람 같았다. 눈빛은 공허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H는 자신의 머릿속에서마저 도망치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한계였다.
H는 ㄱ이란 사람을 싫어했다. 싫어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다. 근래 이토록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은 없었다. ㄱ의 등장, 숨소리만으로도, 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H는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그래서 ㄱ을 피해다녔다. 점점 H는 빌딩의 옥상, 비상계단으로 숨는 일이 잦아졌다. 불 꺼진 비상계단에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고, 탁 트인 높은 옥상에서는 밤에 콘래드 빌딩과 한강변의 건물들, 차들의 전조등과 브레이크등이 뿜어내는 습한 불빛들을 들이마시며 한숨을 몇 번이고 내쉬었다. H는 ㄱ이 없을 때만 숨을 편안히 쉴 수 있었다.
한편 ㄱ은 H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곧잘 일을 하다가도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내 쪼그라들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었다. ㄱ에게 H는 사회성 없는 일 중독자였다. 활달하고 사교성 좋은 ㄱ을 누구나 웃으며 맞아 줬지만, 유일하게 H만이 정색을 하고 그를 대했다. ㄱ은 솔직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종종 있었다.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H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였다.
H는 요즘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꼭 들르곤 했다. 가서 4캔 만 원인 외국 맥주들을 샀으며, 참치찌개 라면 혹은 너구리 라면과 삼각김밥 혹은 햄버거를 샀다. 그리고 낡은 벽돌 빌라의 불이 꺼진 계단을 걸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계단에서 들리는 것은 자신의 구두 소리와 편의점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뿐이었다. 그렇게 3층까지 올라가면 304호인 H의 집이 나왔다. 304라고 적힌 옛날 번호판은 숫자와 테두리가 금속이었는데, 컴컴한 복도에서 아주 희미하게 반사광을 뿜고 있었다.
H는 집에 들어가면 불을 켜지 않았다. 켜기 싫었다. 켜 봤자 보이는 것은 낡고 작은 자신의 단칸방, 곰팡이를 닦아낸 흔적이 있는 벽지, 쇠창살이 박힌 창문, 그 너머로 보이는 다른 빌라의 벽 뿐이었다. 그런 풍경들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H는 집에 들어오면 항상 불을 켜지 않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누워있곤 했다. 가끔은 울었고, 가끔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면 책상 위 스탠드만 켜 놓고 부엌에서 물을 끓였다. 그리고 맥주 캔을 땄다. 항상 코젤 다크나 칭따오였다. 물이 끓고 나면 참치찌개 라면에 물을 붓고 맥주를 마시며 기다렸다. H는 사실 야식을 싫어했다. 배부른 느낌을 갖고 자는 것은 매우 불쾌했다. 그러나 요즘엔 뭐라도 먹지 않고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야식과 맥주를 빼고 누우면 극도의 불쾌함이 찾아왔다.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는 고통 그 자체였다는 생각이 괴롭혔다. 그 와중에 ㄱ을 생각하면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매일 밤 H는 ㄱ을 생각했다. ㄱ은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단지 나쁜 것은 ㄱ을 소유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이었다. 자기검열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ㄱ을 보면 항상 자신의 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너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ㄱ의 왼손 약지에는 백금 반지가 있었다. ㄱ의 성격처럼 아주 심플한, 아무 보석도 박혀 있지 않은 반지였다. ㄱ의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딸 사진이 항상 있었다. 그 화면만 봐도 딸이 얼마나 커 가는지 알 수 있었다. 매일같이 사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H는 맥주 두 캔쯤 마셨을 때면 ㄱ이 자신과 만날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지 검토해 보곤 했다. 반지는 그냥 혼자 낀 거고,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지, 배우자와 이혼한 것은 아닐지, 혹시 폰 화면의 아이가 딸이 아니라 조카가 아닐지. 그러나 항상 모든 가능성은 기각당했고, 처절하게 망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H는 자신이 가정 있는 사람을 노릴 만큼 쓰레기는 아니라는 점에 안도했고, 티끌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했고, 술기운과 함께 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괴롭게 눈을 떴고, 같은 부서의 직장 상사인 ㄱ이 부서 카톡방에 남겨놓은 업무지시를 볼 수 있었다. H는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시작한다. 허름한 빌라를 나와 햇빛을 맞으며 걷고, 한강을 따라 버스를 타고 가면 직장에 도착한다. 유난히 큰 빌딩 창문 덕에 항상 햇빛은 쏟아져 들어왔고, ㄱ은 그 햇빛을 온 등으로 맞는 자리에 항상 있었다. H는 어색하게 ㄱ에게 인사하며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정신 없이 하루가 지나가면 한강에 드리운 어두운 주황빛 노을을 보며 퇴근했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야식을 사고 집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금 울었다. H는 착실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H가 매일매일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며 칭찬했다. 그러나 ㄱ을 만난 뒤 H의 삶은 어느 고통스러운 하루의 무한반복이었다. 마치 해답을 찾아낼 때까지 하루를 계속 반복하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H는 계속, 끝도 없이 ㄱ이 있는 하루를 헤맸다.
H는 ㄱ의 흠집을 찾아내 ㄱ을 싫어하게 되면 이 고통스러운 하루의 반복이 끝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ㄱ을 비난하려고 할수록 추악하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만 마주해야 했다. 그렇게 매일 새벽 2시쯤 되면, 계속 이대로라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H는 억지로 잠에 들었다.
'우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아지 별 이야기 (0) | 2023.04.02 |
|---|---|
| 이탈 - 도망 이후 - (0) | 2022.02.05 |
| 결국은 (2019. 3. 22.) (0) | 2019.07.09 |
| 기억 속에 (2019. 2. 20.) (0) | 2019.07.09 |
| 혹사 (2019. 2. 4.) (0) | 2019.07.09 |

